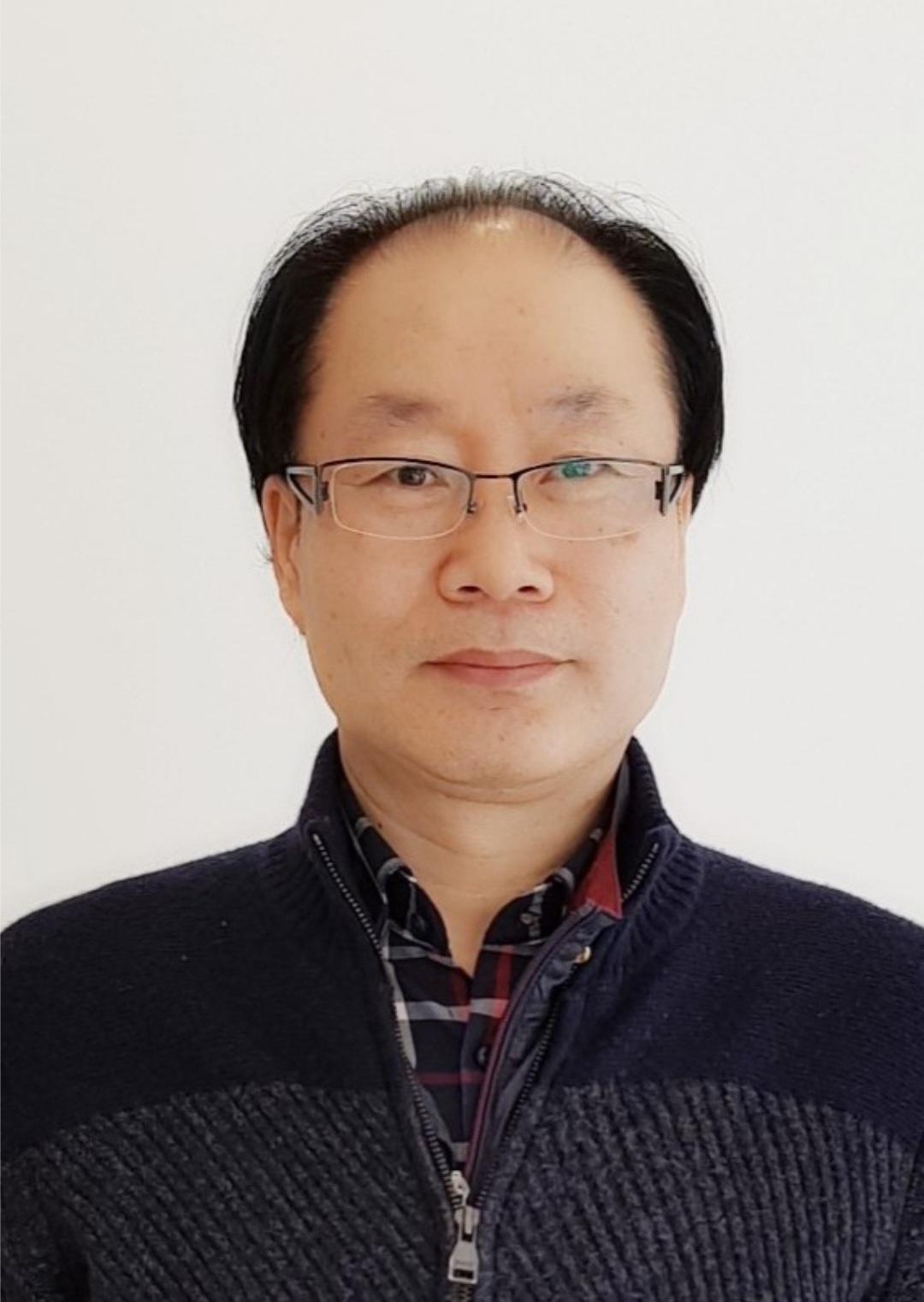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가 반복되면서 대중교통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파업이 예고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시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 기반 버스 운행, 즉 자율주행과 지능형 운영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파업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버스 운행은 흔히 ‘무인버스’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기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사람 중심 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에 가깝다. 현재 기술의 핵심은 자율주행 자체보다도 배차, 관제,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해 버스가 멈추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파업의 토양이 되다
버스 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기사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고령화, 장시간 노동, 낮은 처우로 신규 인력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운행 유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적 인력난은 노사 협상에서 파업 가능성을 상시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이는 “현재의 버스 운행 구조는 인력 한 명이 빠져도 노선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AI 운행은 이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AI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사 수급이 어려운 심야 노선이나 교통 취약 지역에서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
파업의 대체재 아닌 ‘완충 장치’
AI 버스 운행이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술 수준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도심 시내버스를 전면 무인화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다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병원·학교 노선, 교통약자 이동 구간 등 필수 수요를 유지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즉, AI 운행은 파업의 대체재가 아니라 시민 피해를 줄이는 완충 장치다. 전면 파업으로 버스가 ‘0’이 되는 상황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주행보다 현실적인 ‘지능형 운영’
당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보다 AI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승객 수요를 예측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혼잡 구간을 피해 우회 노선을 제안하며,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 기사 동승 상태에서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노사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AI 관제를 통해 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제한된 인력으로도 핵심 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비상수송대책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남은 과제는 ‘기술’보다 ‘합의’
AI 버스 운행의 확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시민의 안전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현장 적용이 어렵다.
문제는 “AI 버스 도입의 핵심은 기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사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된다. 운전 중심 직무에서 관제, 안전 관리, 원격 대응 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교통을 위한 선택지
반복되는 버스 파업과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AI 운행은 이를 단번에 해결할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민의 이동권이 협상의 볼모가 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추는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어떤 속도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