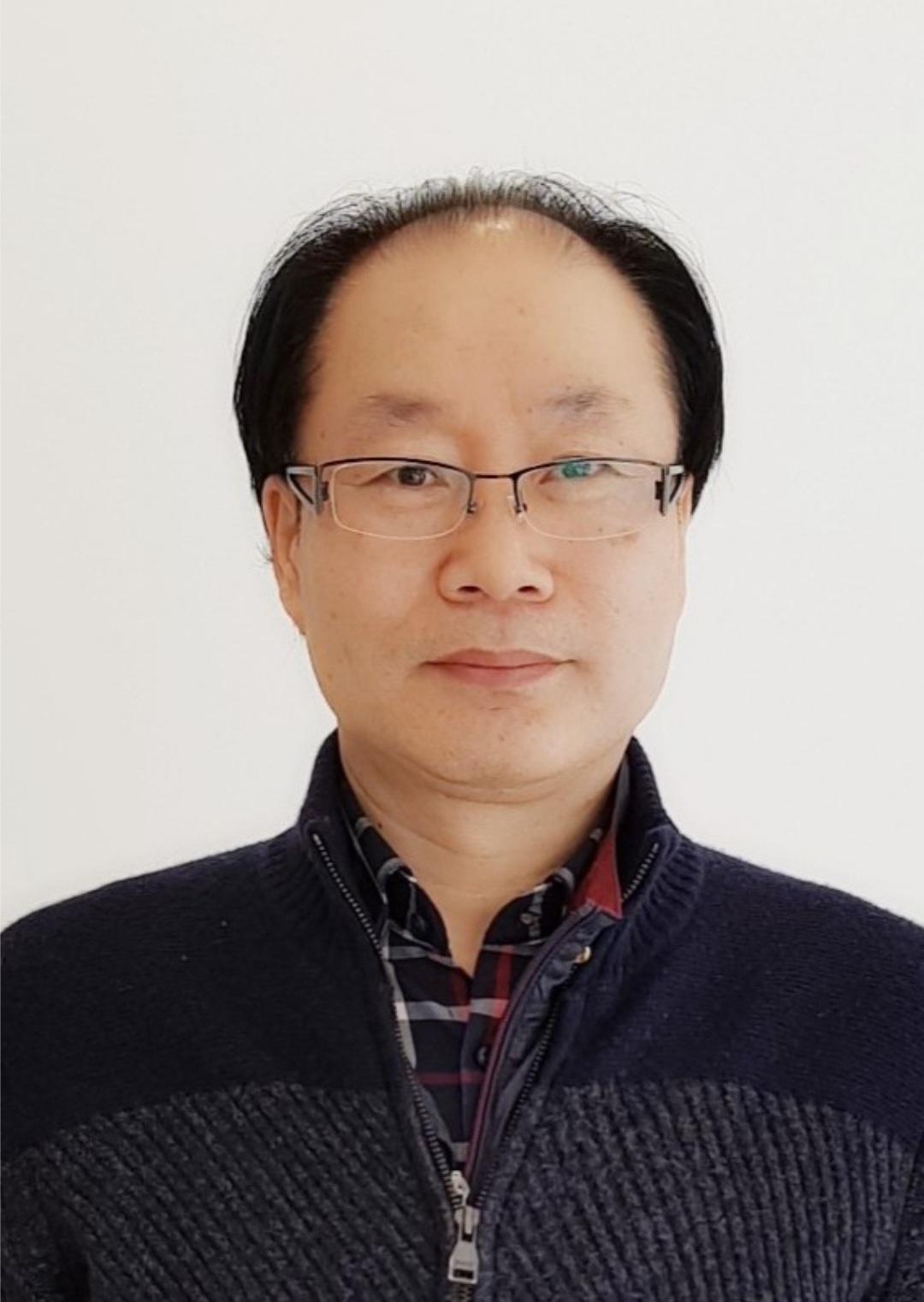지방재정의 현실은 언제나 팍팍하다. 세수는 한정되고, 해야 할 일은 늘 많다. 그런 가운데 강화군이 내놓은 2026년도 예산은 흥미로운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올해 편성된 7,044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눈여겨볼 점은, 이 예산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체감”에 무게를 둔 배분
“체감”에 무게를 둔 배분
예산이 커져도 주민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결국 ‘행정만 아는 예산’으로 끝난다.
강화군은 이 문제의식에 응답하듯, 운영비·여비·축제성 사업을 줄이는 대신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행정 조직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사업 추진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길일지 모르지만, 주민 눈높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생활인프라·농어업·지역 활력 분야 등 ‘체감형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총 2,529억 원, 전체의 약 36%에 달한다. 그만큼 ‘예산의 흐름’을 주민 중심으로 돌려놓았다는 얘기다.
일상과 삶의 질에 닿는 복지, 생활 인프라 투자
복지 분야에 1,400억 원이 투입된 것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다.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장애인복지·노인일자리 등은 주민이 바로 체감하는 생계 기반이다.
생활 인프라 분야의 559억 원 역시 소리 없이 지역을 바꾸는 힘이다. 하수도 정비, 주민복합센터, 청소년수련관 같은 사업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의 편의와 지역의 안전성을 묵묵히 높여준다.
농·축·어업 지원(361억 원)과 지역 활력 조성(209억 원) 또한 강화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전체의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정주여건이 무너지면 젊은 층이 떠난다. 체감형 예산이 단순한 ‘당장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인 이유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소모성 경비를 줄였다는 점이다.
행정조직의 경상경비를 손대는 것은 늘 부담스럽고 내부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재원을 군민 중심 사업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 없이는 체감형 예산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예산의 방향이 곧 행정 철학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예산 배분은 가장 솔직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며, 어느 곳에 돈을 쓰는지가 곧 그 지역의 철학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이번 예산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예산은 늘 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느냐다. 이번 강화군 예산은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화군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주민이 예산의 변화를 삶의 변화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