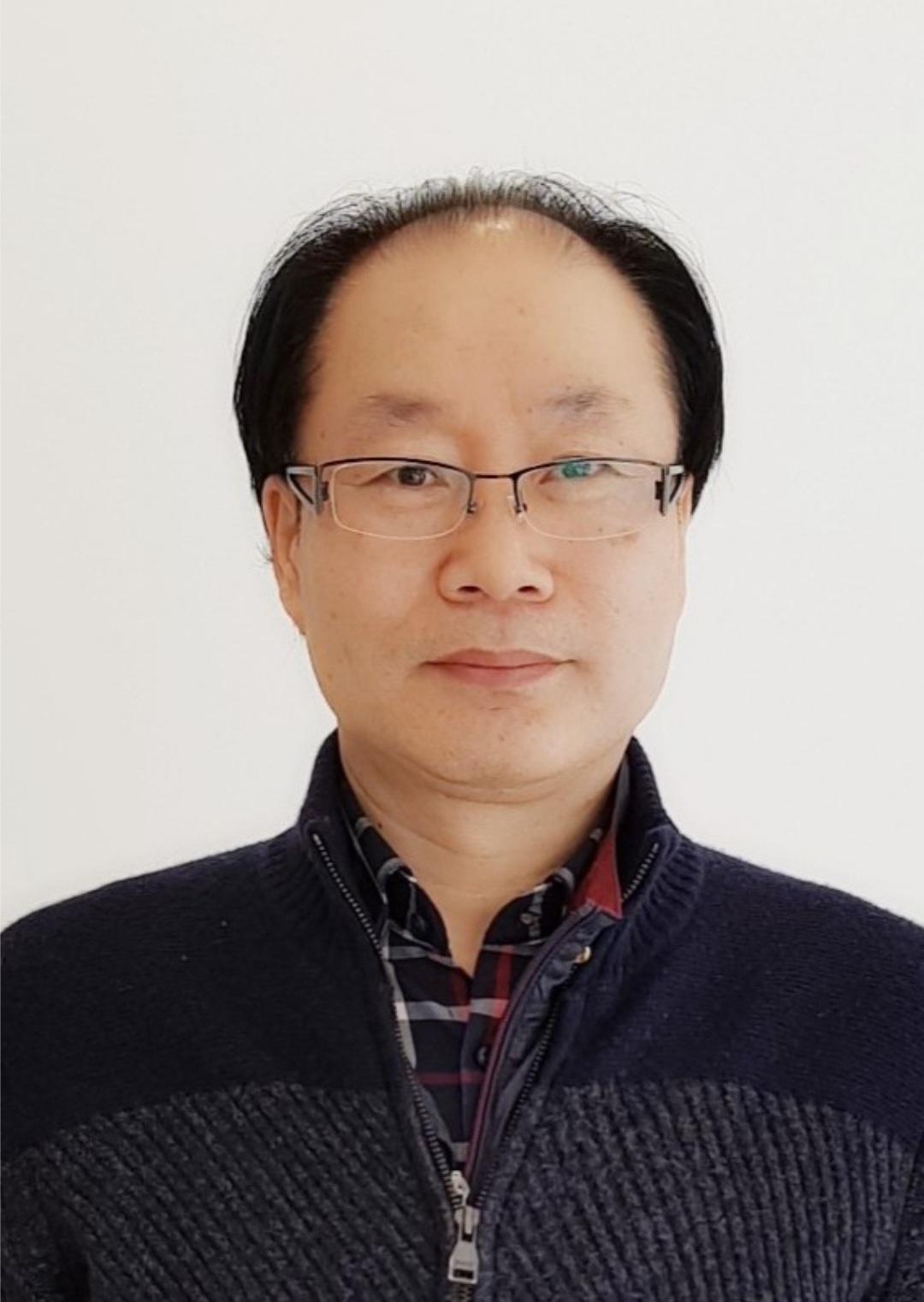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여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을 끝자락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 여주 오학동으로 특별한 옹칼을 만나러 갔다. 이름부터 정감 가는 ‘옹칼’. 옹심이와 칼국수를 한 그릇에 담은 음식이다. 맛 좋기로 소문난 여주의 한 옹심이집을 찾았다.
자리에 앉자 곧 열무김치와 무채김치, 그리고 소량의 보리밥이 나왔다. 보리밥에는 약간의 쌀밥이 섞여 있어, 거칠지 않으면서도 투박한 맛이 좋다. 보리밥 위에 열무와 무채를 적당히 얹어 비벼 먹으니, 입맛이 슬슬 돌기 시작한다.
잠시 후, 주인공인 ‘옹칼’이 커다란 냉면 그릇에 담겨 등장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하다. 다 먹은 보리밥 그릇에 조심스레 옹심이와 칼국수를 덜어 담고, 먼저 옹심이부터 집어 먹어본다.
그런데 어딘가 낯설다. 익숙한 옛날의 그 맛이 아니다. 이어서 칼국수도 먹어봤다.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하다. 옹칼은 싱겁고, 국물도 깊은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구수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그 예전의 맛을 기대했지만 아쉬움이 든다.

 옹심이는 감자와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진다. 감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변하며 색이 어두워진다. 칼국수 면은 메밀이 섞여 있어 더 진한 회색빛을 띤다. 그래서인지 옹심이는 연한 회색, 칼국수는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
옹심이는 감자와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진다. 감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변하며 색이 어두워진다. 칼국수 면은 메밀이 섞여 있어 더 진한 회색빛을 띤다. 그래서인지 옹심이는 연한 회색, 칼국수는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
뜨끈한 옹칼 한 그릇을 식혀가며, 열무김치 한 젓가락, 무채김치 한 젓가락을 번갈아 곁들이니, 어느새 커다란 냉면 그릇은 비어간다. 누군가는 그릇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먹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다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
식사를 마친 후 가게 안을 둘러보니, 인테리어가 눈에 띄게 변한 것이 보였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틀 전에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한다. 벽과 천장, 그리고 실내 일부가 확장되어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테이블은 샌딩 후 새롭게 락카칠을 해 깔끔한 느낌을 줬다. 다만, 의자와 바닥, 출입문과 현관은 그대로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속이 약간 꿀꿀한 느낌이 든다. 열무김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속이 약한 사람이라면 적당히 먹는 게 좋겠다.
적당한 기대, 적당한 양, 적당한 반찬.
옹칼은 그런 음식이었다. 잔잔하게 배를 채우고 싶은 날, 묵직한 한 끼보다는 포근한 위로가 필요한 날에 어울리는 옹칼의 소박한 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