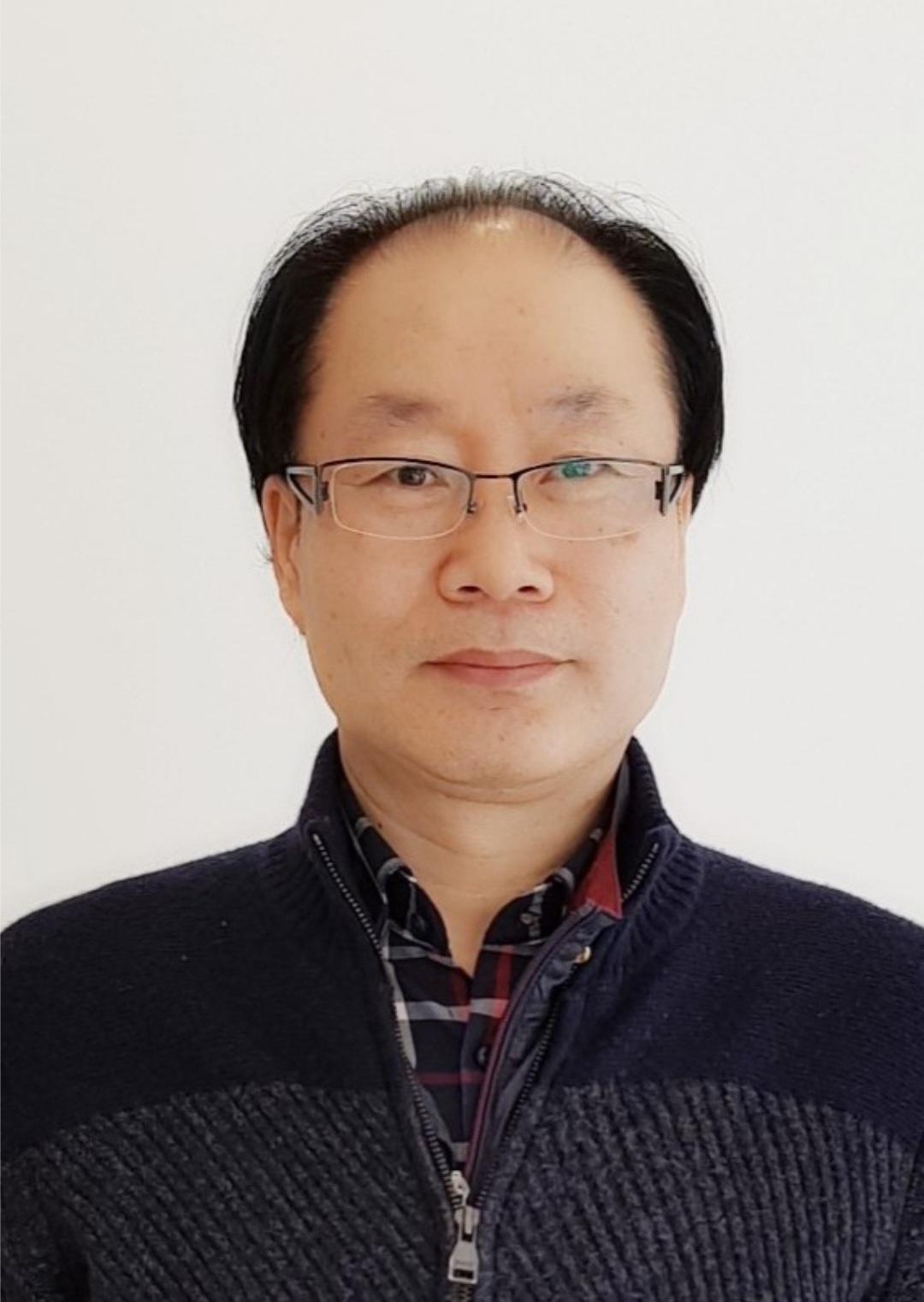성남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가 올해 마지막 순서를 마쳤다.

연단에 선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는 우주를 이야기했지만, 그가 결국 바라본 것은 우주가 아닌 ‘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세계’에 가까웠다.
강연의 제목 ‘물리학으로 보는 나’는 결국 우주라는 가장 큰 스케일로부터 한 사람의 존재성을 되묻는 과정이었다.
김 교수는 강연의 첫 문장을 이렇게 열었다.
“우주는 무한하다."
그러나, 그 무한이라는 말도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세계를 되돌아보라는 도전적 선언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곧 ‘나 자신’을 만든다
우주는 언제나 인간에게 질문이었다.
고대 인도에서 거북과 코끼리, 지구 위에 그리고 뱀 안에 지구가 놓인다고 믿었던 세계관부터, 중국의 천원지방,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 단테가 고민했던 “땅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물음까지..
이 각각의 세계는 틀린 답이기 이전에 그 시대 인간이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김 교수는 “우주란 인간의 이해 속에서는 질서(cosmos)로, 탐험의 대상으로는 공간(space)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우주가 무엇이냐보다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곧 세계관이고, 세계관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빛으로 8분, KTX로 57년… 거대미세가 남기는 질문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빛으로 8분에 불과하지만, 같은 거리를 KTX로 달리면 57년이 걸린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1년 달력에 압축하면,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에야 등장한다. 명왕성에서 본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다. 그안에 우리가 있다.
이 극단적인 크기의 비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과학적 질문이 아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붙잡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무엇으로 향하는가?
김 교수의 설명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웠다. “우주의 크기를 알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명확히 보게 된다”는 그의 말은, 그 자체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경고다.
복잡계의 세계… ‘관계’는 우주보다 더 크다
김 교수의 전공인 통계물리학, 특히 복잡계 이론은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25명만 모여도 가능한 연결망은 300개에 달하고, 연결·비연결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10의 80승을 넘어선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 수와 비슷한 규모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가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의미다.
혈액형이 곧 성격을 만든다는 믿음도, SNS에 넘쳐나는 ‘수많은 사진들’도 결국 각자 하나의 사진이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일 뿐이다.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다고 믿지만, 그 또한 소비된 정보의 편향이 낳은 편견이다.
“복잡성은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얼음은 물분자의 성질이 아니라, 수많은 분자가 모여 만들어내는 집단의 성질이다.”
이 말처럼 인간의 삶도 결국 관계라는 집합적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한한 우주’라는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한다
김 교수의 강연은 과학 강의였지만, 결론은 인간학에 가까웠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 믿음 자체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오래된 세계관의 관성임을 우리는 잊곤 한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무한이라는 막연한 배경을 지운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비로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상공회의소 정영배 회장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를 찾는 일이 조직과 사회의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김 교수의 메시지와 정확히 맞닿는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믿음이 우리를 규정해온 오랜 프레임이라면, 이제는 그 프레임을 벗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우주는 크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깊이는, 어쩌면 그보다 더 무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