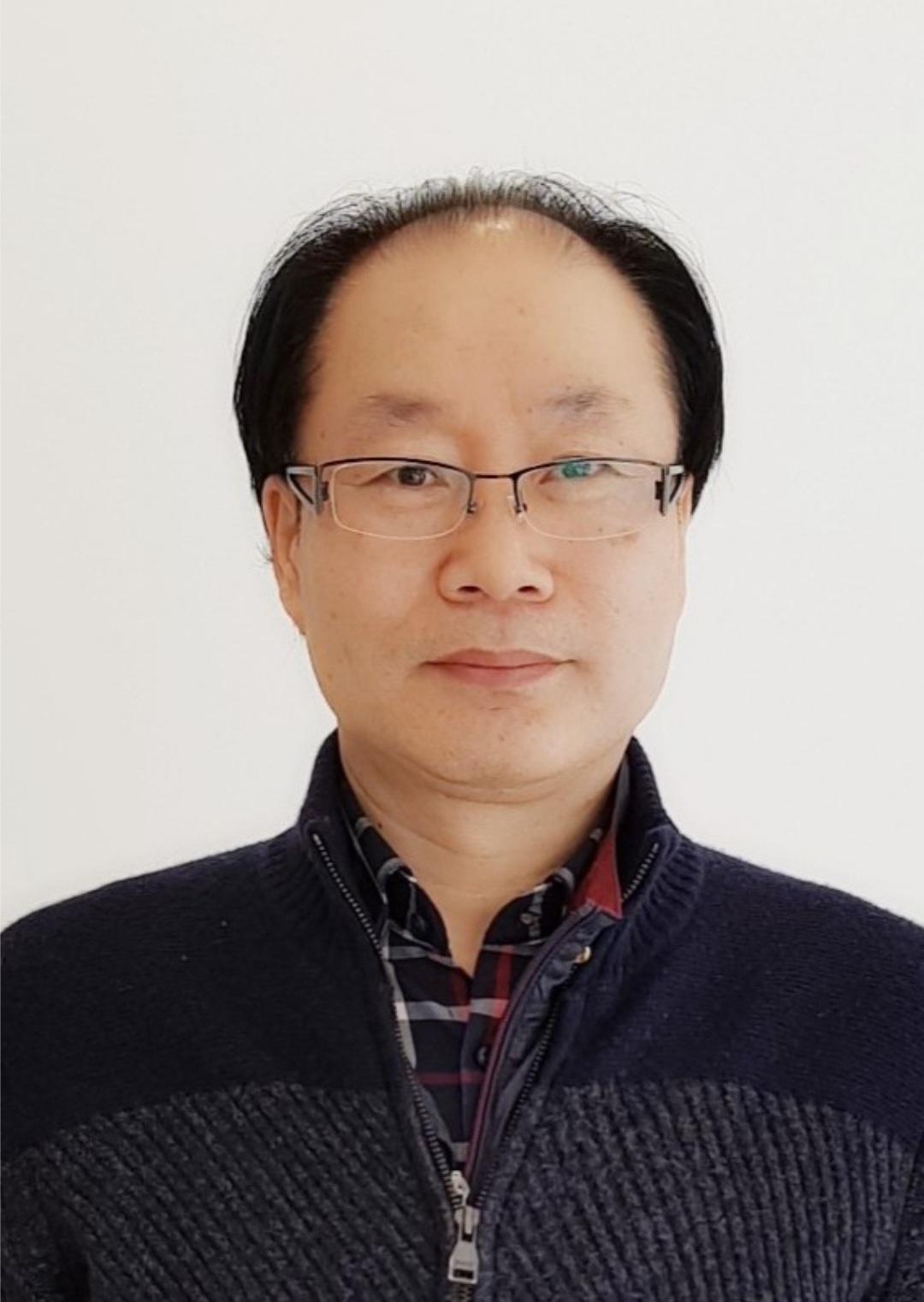표면적으론 자유무역과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자국 규제망 안에 가두려는 미국의 정책이 ‘기만적 산업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고율 관세, 비자 제한 등은 겉보기와 달리 동맹을 향한 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자원, 인력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정당화는 늘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동반했다. 그 결과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이른바 ‘우방국’ 기업들은 이 프레임 안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진짜 표적은 ‘동맹 기업’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발맞춘 동맹국 기업들조차 더 가혹한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요청과 IRA 인센티브를 따라 조지아에 총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고용 창출까지 나섰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IRA 조건을 앞세운 일방적 일정 압박, 노동비자 발급의 비현실성, 그리고 최근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의 대규모 이민 단속 및 체포 사태였다.
중국과는 대립하고, 동맹과는 협력한다고 했던 미국의 ‘공급망 동맹 전략’이 사실상 통제 가능한 산업을 자국 안에 ‘가둬두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만의 3단 구조: 인센티브 → 압박 → 규제
1단계: 당근(IRA 세액 공제)
북미 내 생산 시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혜택 제공
세제 유인으로 외국 기업 유치
2단계: 조건(북미 생산 의무 + 일정 강제)
생산 지연 시 세금 혜택 자동 상실
조기 준공 압박 → 인력 수급 불균형 발생
3단계: 단속(비자·고용 규제 강화)
기술 인력 조달을 위한 단기 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
대규모 단속 및 체포 → 외교 문제로 비화
"중국보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이라는 불만
중국의 산업 정책은 분명 불투명성과 국가 주도의 색채가 짙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에 시달린다”고 토로한다.
중국은 일정 정도의 규제를 명확히 고지하고,
미국은 규제를 ‘민간 협력’으로 포장하면서 사후적으로 압박과 단속을 가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덫'으로?
한때 미국은 기술과 자본, 제도의 투명성을 앞세워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꼽혔다. 그러나 지금은 IRA, 칩스법, 고율 관세, HSI 단속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정작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제약과 감시에 시달리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마치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되는 현실은 동맹 파트너십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기술 보호' 아닌 '정책 신뢰'부터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전략은 '기술 안보'의 이름으로 동맹을 길들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맹은 일방적인 통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한 정책 조율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의 ‘인센티브’에만 기대지 않는다. 그 뒤에 숨은 기만적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탈미국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경제의 모범이 아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과 '규제의 덫'을 만들어 동맹까지도 산업 전쟁의 무대에 올려놓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정작 자국의 신뢰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세계는 미국이 진정 동맹과의 ‘협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