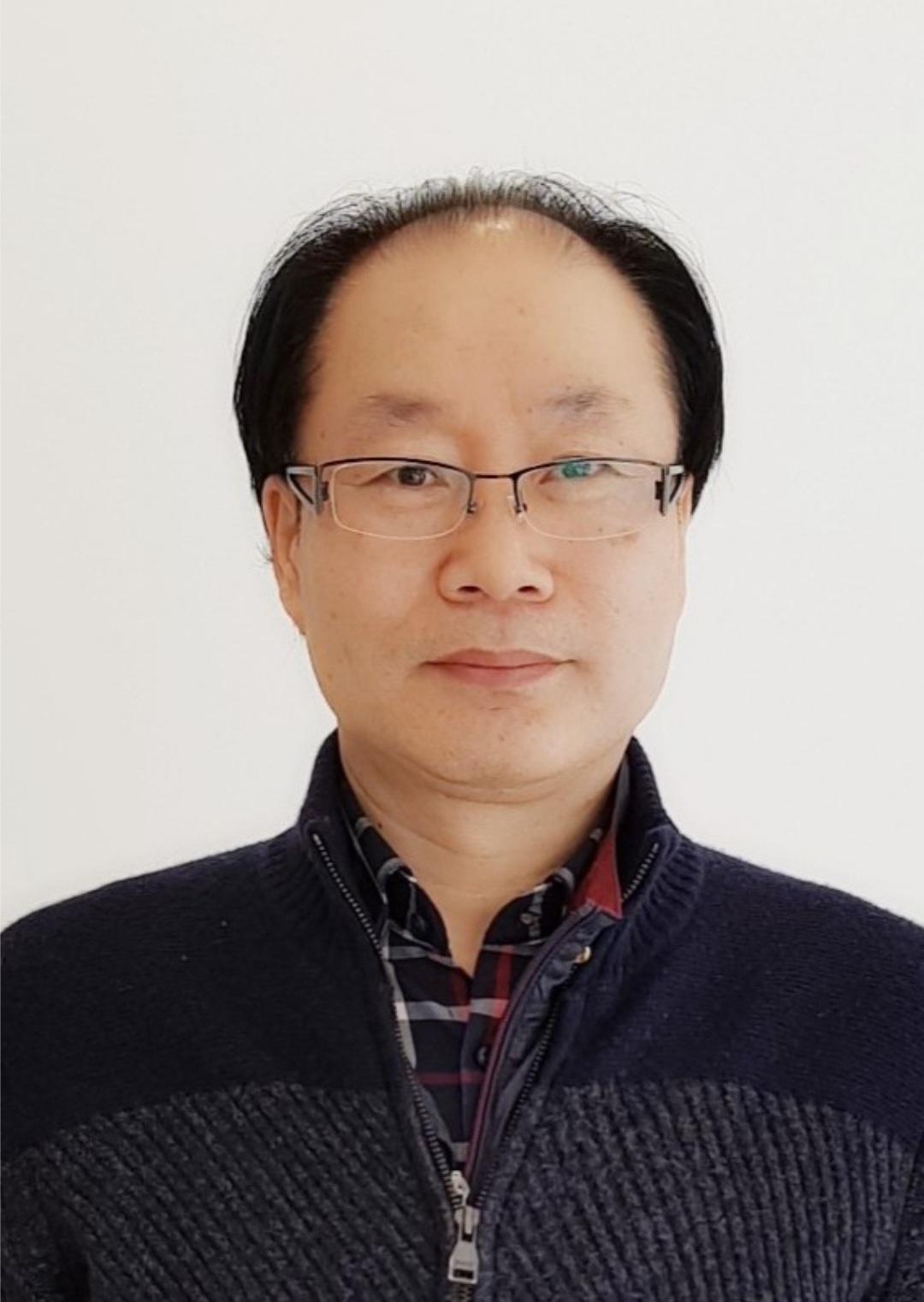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열린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는 광명시에서, 그 기치와 정반대의 행정 운영이 시의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 국장실을 외부와 단절된 밀실처럼 운영하고,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을 사실상 개인비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정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현장을 찾은 언론의 방문조차 폐쇄된 구조와 비서의 차단으로 가로막히고,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답변 이후 외부인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운영의 문제를 넘어, 공적 공간이 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운영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광명시에서, 국 장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사실상 비서처럼 운영하고, 민원인이나 방문객 응대까지 전적으로 맡기고 출입을 통제하는 있는 현실은 예산 낭비는 물론 공직자의 책임 회피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장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사실상 비서처럼 운영하고, 민원인이나 방문객 응대까지 전적으로 맡기고 출입을 통제하는 있는 현실은 예산 낭비는 물론 공직자의 책임 회피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행정의 기준은 ‘얼마나 시민 가까이 있는가’에 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투명한 공간에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그런데 국장실 문 하나가 세상을 가로막고, 비서라는 벽이 소통을 차단한다면, 그것은 과거 군림하던 관료 행정으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장 한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행태가 광명시의회라는 공적 조직 안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시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자리한 공직자는 개인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신뢰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시작은 사적 권위를 내려놓고, 국장실 문을 여는 것부터다.
광명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경미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