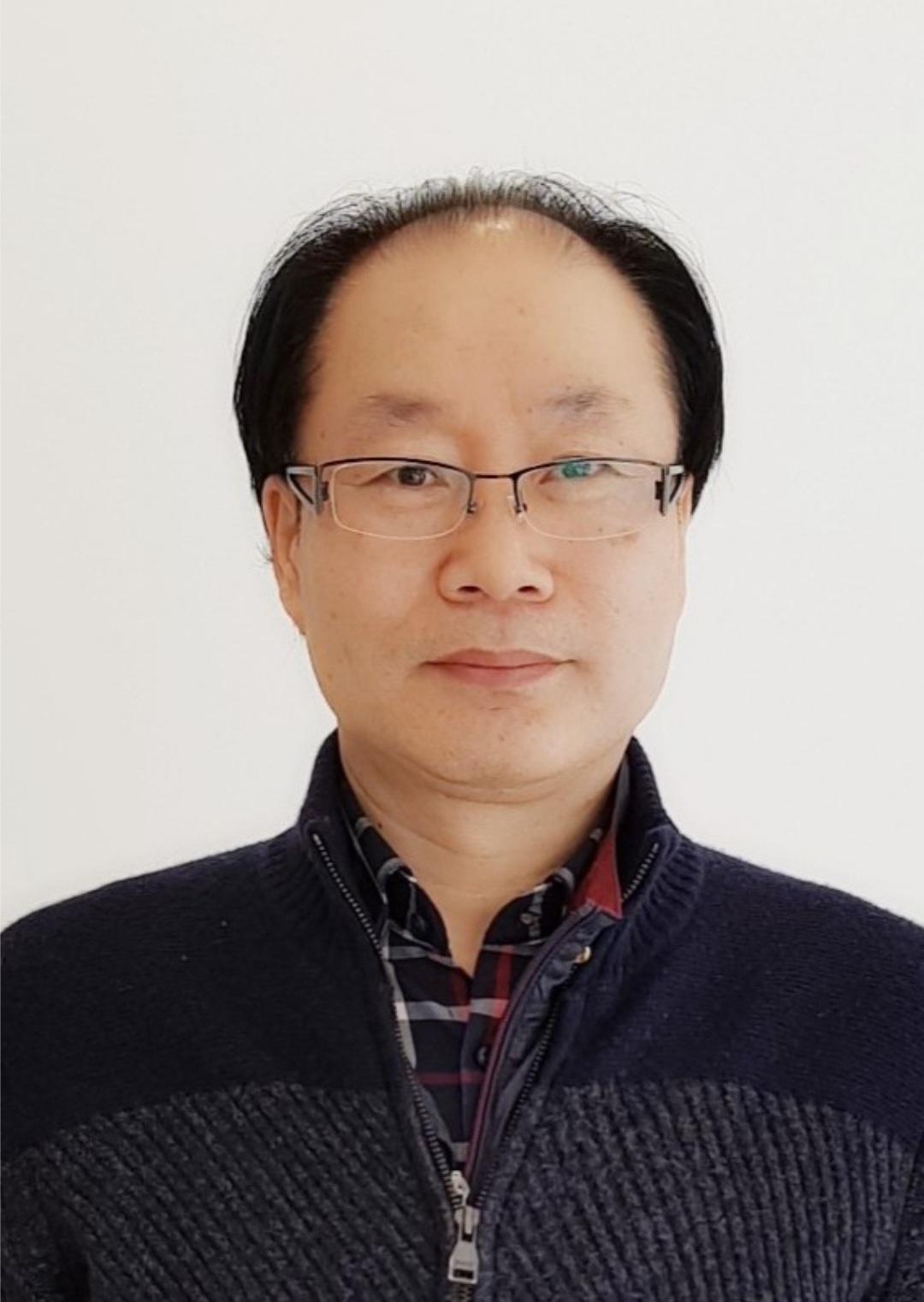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5일 진행된 ‘국민임명식’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대표들이 다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겉으로 보기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다시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형식이어서, 아이러니하고도 생경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상징적 구조가 지닌 정치적 메시지를 단순한 행사로 치부하긴 어렵다.
행사 측은 “국민임명식은 국민주권을 형식적으로 구현한 상징적 정치 행위”라고 설명한다. 국회의 동의도, 정당의 절차도 없이 오직 국민대표 80명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전달함으로써,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존 틀과는 다소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대표가 대통령을 다시 임명한다는 구조는, 삼권분립 원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이 통치자를 확인하고 승인한다’는 정치적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 정치(symbolic politics)는 현대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도와 법률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임명식은 바로 그 장면을 의도한 시도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연출한 셈이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있다. 국민임명식에 참여한 국민대표는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결국, 대통령이 선별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다시 승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 보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 정당성과 상징적 정당성 사이의 간극은 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권력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뜻은 제도 바깥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왕조 시대엔 신하들의 추대를 통해 군주의 정통성을 확인했고, 현대에 이르러선 선거와 제도를 통해 통치권이 위임된다. 국민임명식은 이 제도 바깥에서 국민의 뜻을 다시 표현해보려는 시도이며, 어쩌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와 ‘확인’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진화된 방식일 수 있다.
이 행사가 진정한 ‘국민주권’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 신뢰와 정당성에 있다면, 국민임명식이 던진 실험적 물음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