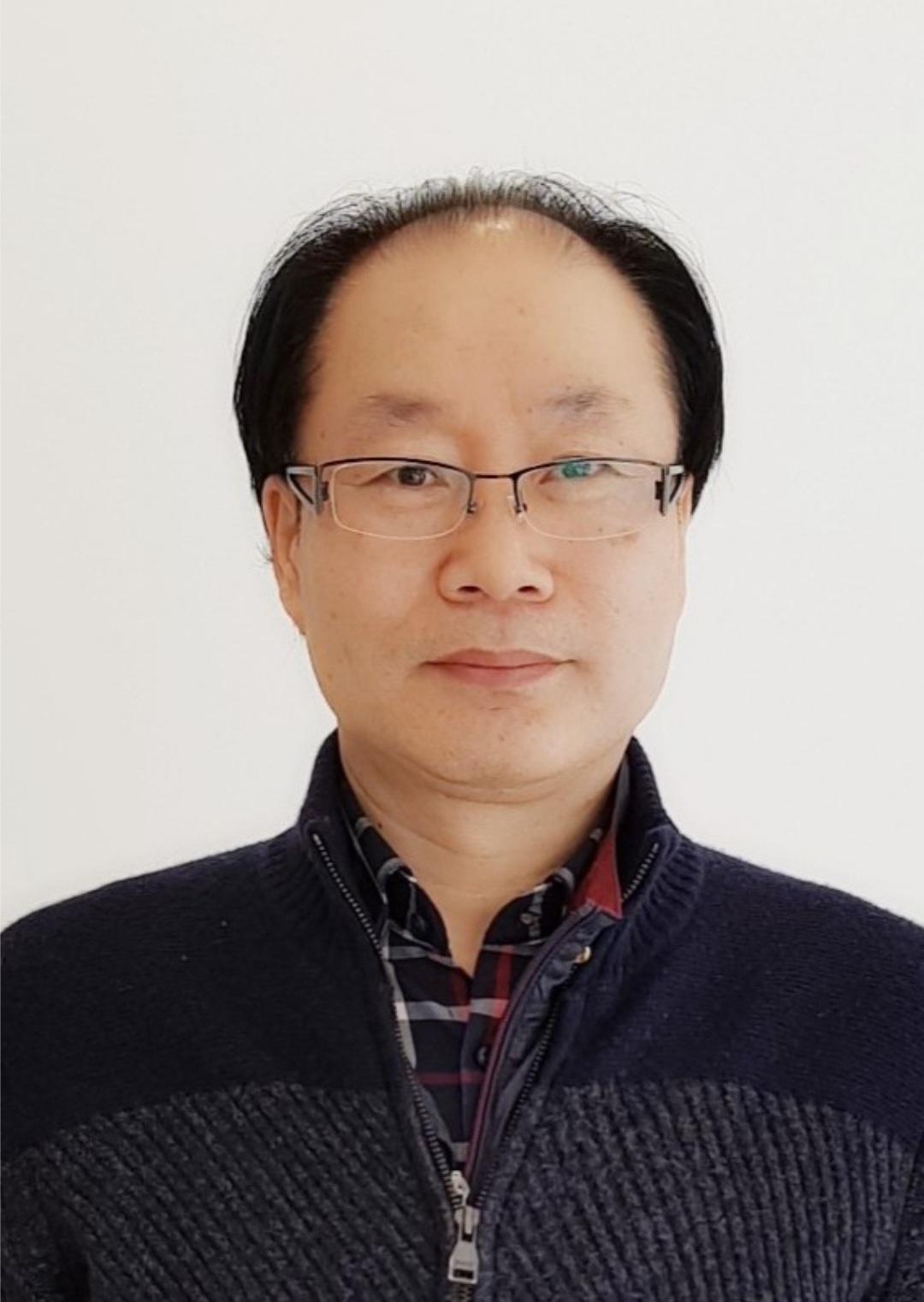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찰청 출입기자단 간사가 일정 조율 중이다.’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다 보면 기자단 대표를 뜻하는 ‘간사’라는 표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를 공무원 조직에서 쓰는 ‘비서’ 정도로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자단 회의를 주관하는 중간 간부쯤으로 여긴다. 그런데 왜 하필 ‘간사’일까? ‘대표’나 ‘단장’ 같은 익숙한 표현이 아닌, 어딘가 일본식 냄새가 나는 이 용어는 어떻게 기자단의 상징이 되었을까?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일본 기자클럽 문화의 흔적,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은 한국 기자단의 자율적 구조 때문이다.
일본의 기자클럽(記者クラブ)에서는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를 ‘간사사(幹事社)’, 그 역할을 맡은 기자를 ‘간사(幹事)’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기관이나 정당, 대기업 등 출입처의 브리핑이나 취재를 기자단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대표해 소통하는 실무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계는 광복 이후에도 이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고, 간사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
흥미로운 건 이 ‘간사’가 공식 직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자단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다. 누가 간사가 될 것인지, 언제 바꿀 것인지도 내부 합의로 정한다. 대체로 중견 기자가 맡고, 언론사별 순번제로 순환한다. 그 기자는 특정 시기 동안 출입처 공보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기자단 공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민감한 브리핑의 질의응답 형식까지 조정한다. 말 그대로 기자단의 실무 총책임자다.
때로는 ‘회장’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규모가 큰 기자단에서는 간사와 회장을 따로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이때 회장은 대외적인 명목상 대표이고, 간사가 실질적인 운영자다. 물론 기자단에 따라 회장은 생략되고 간사 체계만 유지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간사’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언론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기관과 언론 사이의 접점을 만들며, 때로는 질문 하나에 기자단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다. 언론 자유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자단 간사의 선출 방식이나 투명성, 폐쇄성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다. 간사라는 자리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기자단 전체가 권력 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단 간사는 이름 그대로 ‘간사롭지’ 않아야 한다. 기자단 내부의 조정자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언론 자유의 방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이름이지만, 그 무게는 지금도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