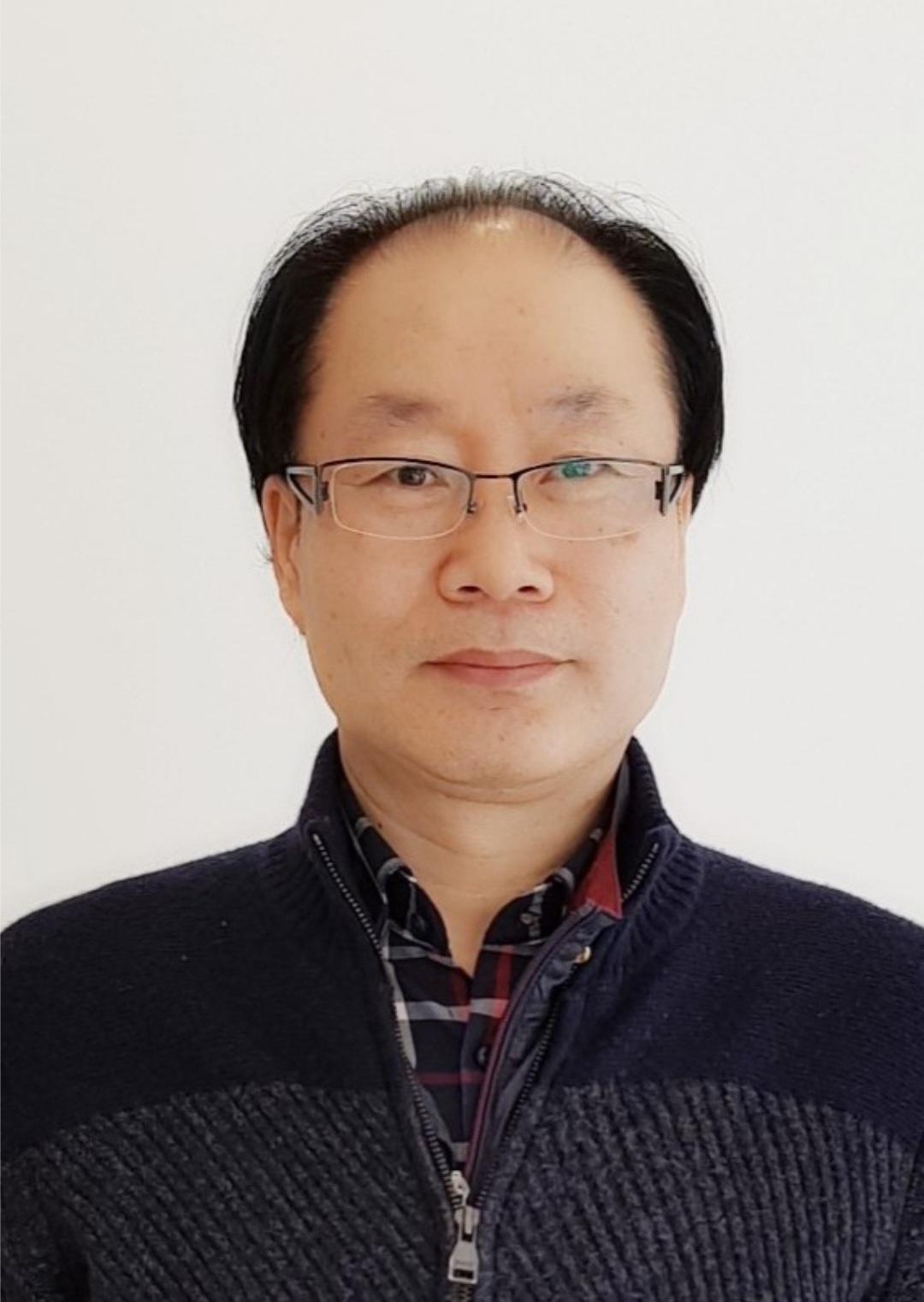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오히려 비효율과 편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은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은 단순한 근무시간 개념이라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강조하는 근무문화 또는 근무환경의 지향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예: 9시~18시)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함으로써 근로자가 업무를 마친 후 개인 시간과 가족, 여가, 휴식 등의 ‘저녁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무 문화이다.
그럼에도,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상시적 근무의 연장선처럼 고착화되며 행정조직의 기강 해이와 예산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업무의 효율성 개선이나 근무시간 내 집중 근무보다,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정시 퇴근은 눈치가 보인다”, “시간외근무가 있어야 실적이나 평가가 좋다”는 조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생산성 향상보다 ‘보상 중심의 근무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특정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5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보다 ‘수당 소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형식적 근무의 연장이 권장되는 셈이다.
한 지방 공무원은 “시간외근무가 실질적인 업무 보완보다 ‘돈이 되는 근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아쉽다”며, “오히려 주어진 시간 내 효율적 근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조직문화 문제를 넘어, 공공 예산의 누수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업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될 경우,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 또한 ‘더 일할수록 더 받는다’는 인식은 근로기준의 기본 취지인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도 충돌한다.
행정전문가들은 “근무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시간외근무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시 근무 원칙 강화, 불필요한 연장근무 통제, 성과 중심의 근무문화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