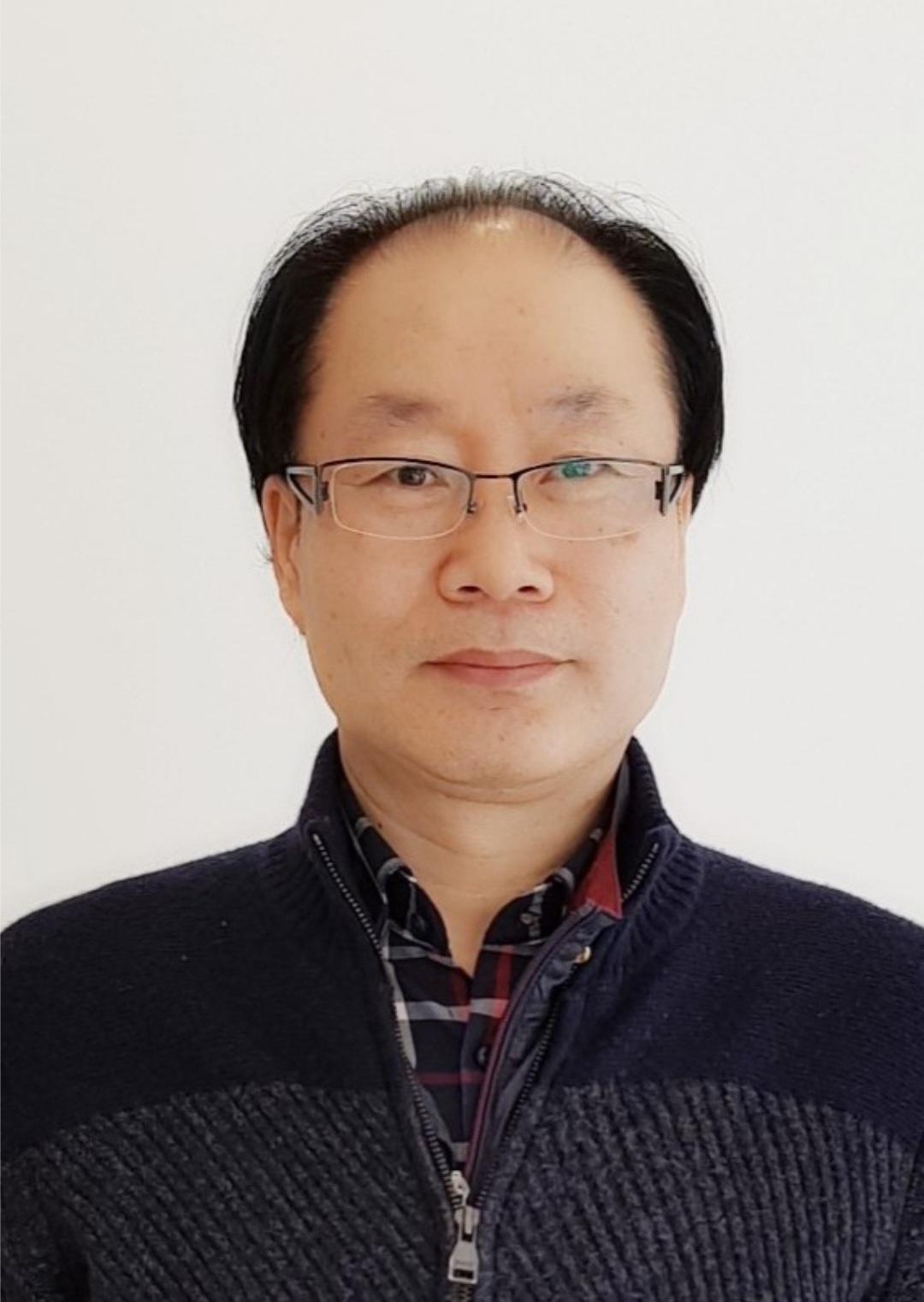바람 속에서, 먼지처럼 날아든 꿈 하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천둥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씨앗.
그 옛날, 민중은 발 아래에 짓눌려
왕의 세금, 양반의 노비, 침묵의 쇠사슬에 묶여
자신의 이름보다 주인의 이름을 더 먼저 말하며
노예처럼,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때로는 분노가 들끓었고
불꽃이 마을을 뒤덮었으나
그들은 짓밟혔다.
들판의 불씨처럼, 쉽게 꺼졌다.
황무지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비가 와도, 햇볕이 비쳐도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씨는 왔다 — 먼 나라의 종소리처럼.
자유.
그 이름을 등에 지고
종교의 외투를 두른 채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였다.
“너희도 사람이다.”
“너희의 삶에는 자유가 있다.”
그 씨는 점점 자라났고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그 나무는 약하다.
폭풍은 끊임없이 가지를 꺾고
어둠은 그 줄기를 비틀려 한다.
자유의 나무는 절대 스스로 설 수 없다.
사람들이 손을 모아
뿌리에 물을 주고, 가지를 감싸 안아야
그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돌보는 이가 있을 때에만 살아남는다.
바람은 계속 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
그 바람 속에서도
자유는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