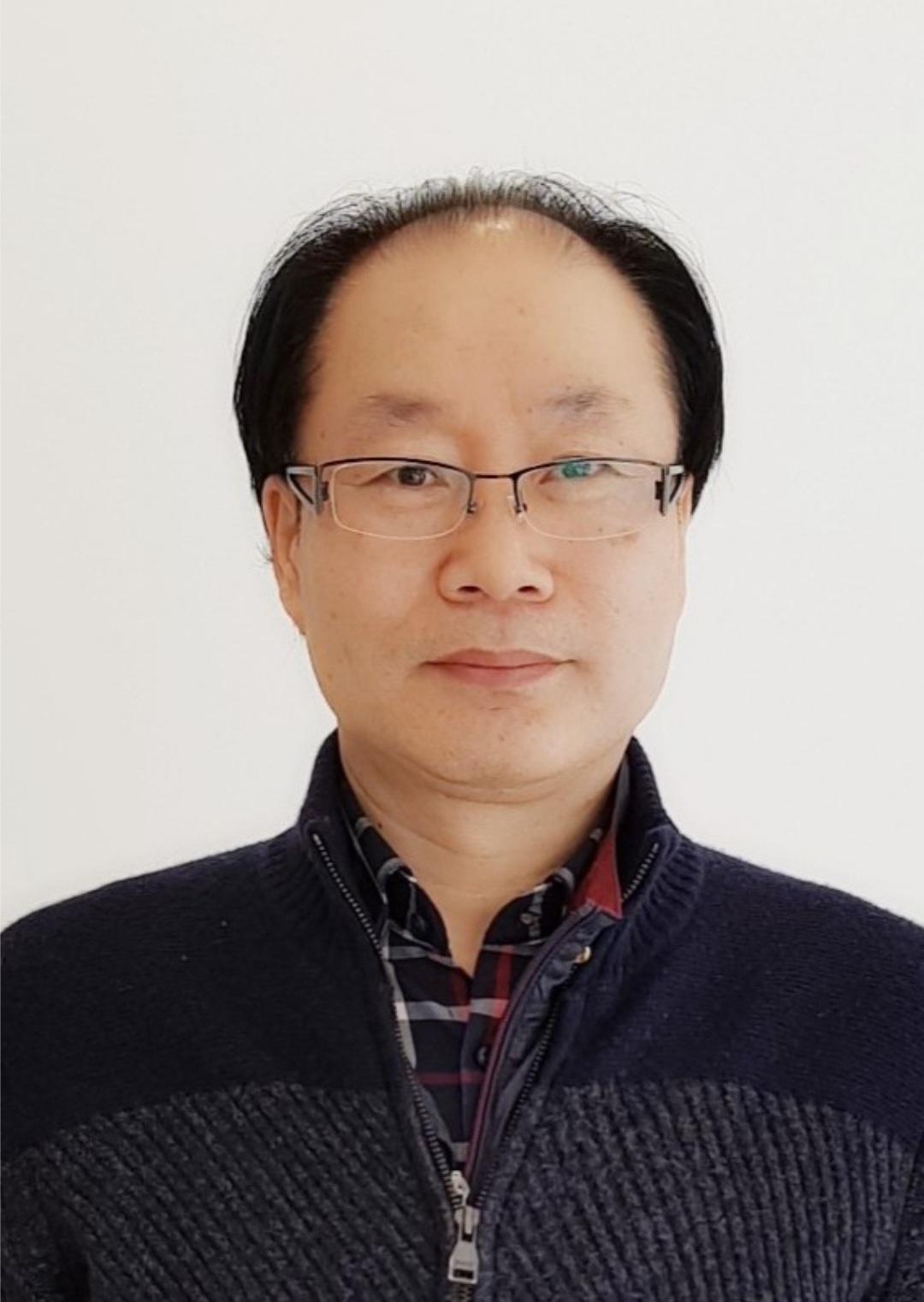제1편: 변방의 불꽃, 라이렌의 맹세
서쪽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왕의 말발굽 아래, 들판은 침묵했고
백성의 입은 굶주림에 다물어졌으며
아이의 울음은 칼끝에 삼켜졌다
그러나 그 밤,
변방의 불모지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칼처럼 솟아올랐다.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왕의 목을 향해 걷는다.”
그의 이름은 라이렌,
한때 왕국의 방패였던 자,
이제는 왕국의 심장을 겨누는 창.
그는 고향을 불태운 불길 속에서
피묻은 깃발을 들어올렸다.
망명자들이, 떠돌이들이,
숨죽인 자들이 그 아래 모였다.
한 나라가 깨어났다.
칼을 들어, 주인을 부정했다.
피로 쓴 복수가 아니라
새벽을 부르는 칼날이었다.
제2편: 사자의 침묵
깊은 감옥, 빛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사자는 잠들어 있었노라
한때 세상을 무릎 꿇게 했던 이빨과 발톱,
이제는 녹슬고 말라버린 전설
그러나 왕은 그를 다시 꺼냈다.
공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왕좌를 위해.
“너는 내 짐승이었다.
한 번 더 물어라.
네 발톱으로, 내 적을 찢어라.”
사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스스로 전장을 찾았다.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피를 흘리겠다.
그러나 이번엔,
나의 뜻으로.”
그리고 그는 마주쳤다 —
불꽃의 장수, 라이렌.
그들은 검을 교차했고,
서로의 고독을 마주했다.
사자는 침묵했고
라이렌은 분노했으며
그 싸움은 승부가 아니라
길을 묻는 것이었다.
제3편: 왕좌의 붕괴, 해방의 새벽
왕은 보았다
자신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권좌의 모래를
누군가는 신이라 부르던 힘이
이제는 백성들의 칼끝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자는 돌아왔다.
왕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고,
검을 들지도 않은 채,
그저 마지막 한 마디를 남겼다.
“나는 너의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른 이들을 위해,
그 괴물은
피 대신 사람을 살렸다.
라이렌은 성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왕과 마주 섰다.
“죽이라” 외치는 함성 속에서
그는 검을 거두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를 끝낸다.”
왕좌는 무너졌고,
군중은 침묵 속에서 울었다.
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리는
칼보다 무거운 자유였다.
종장의 시: 해방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이름 없는 자들은 다시 이름을 가졌으며
칼을 쥐었던 손은 땅을 갈기 시작했다.
라이렌은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처음으로 자유를 말한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어딘가,
사자는 홀로 걷고 있었다.
이름 없이, 깃발 없이,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해방의 칼날》은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해방은 칼로 오지 않지만,
그 칼은 해방의 길을 처음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