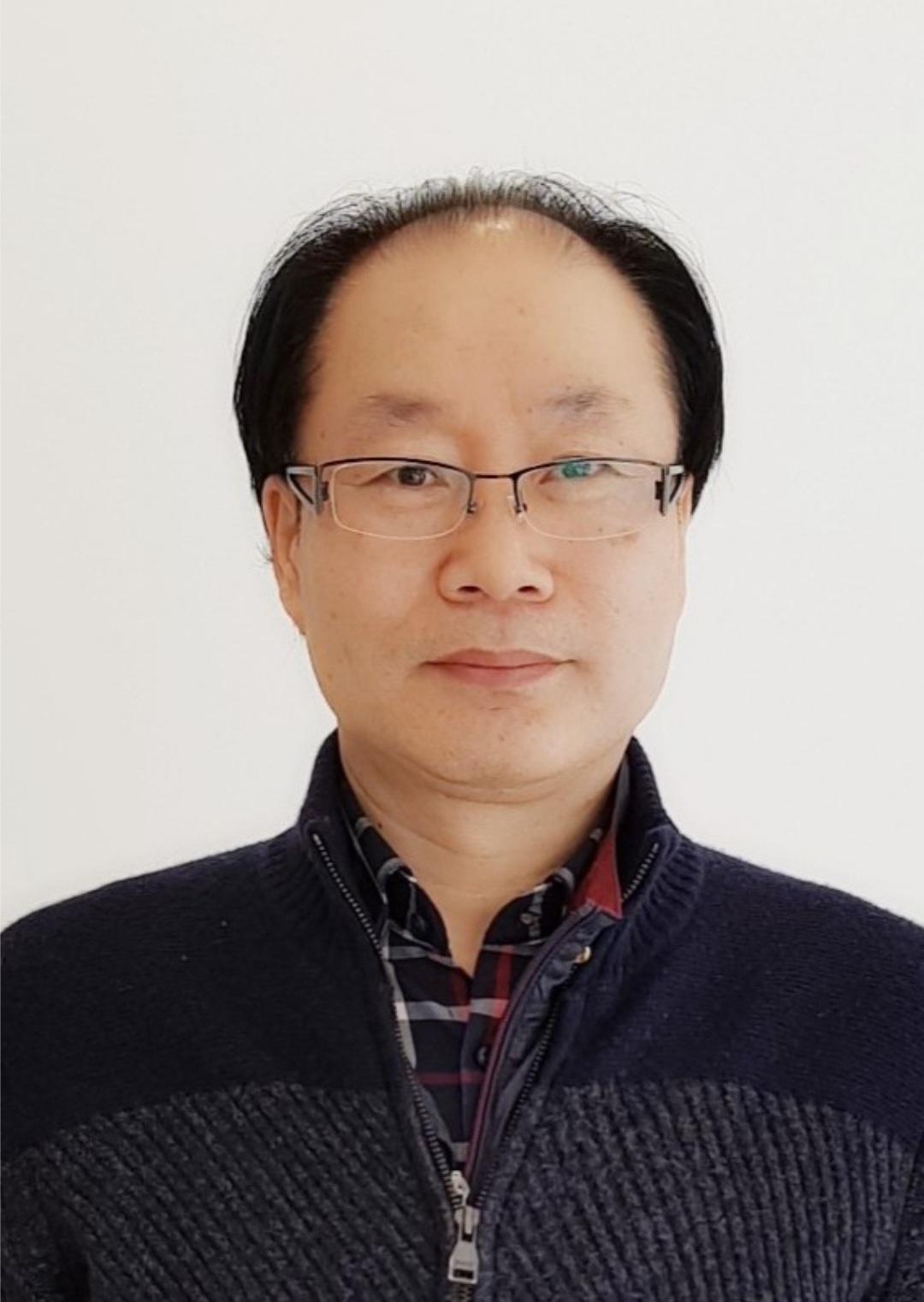【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로 불렸던 도시가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출범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붙었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대까지 등에 업었다. 그것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도시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밤이 되면 불 꺼지는 신도시,
텅 빈 상가,
사라지는 사람들,
줄어드는 기대,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공무원들과 의원들.
세종시는 지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침묵하는 도시
세종시의 가장 큰 위기는 침묵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무원 사회는 안일하다. 시민사회는 조용하다. 시의회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판은 사라졌고, 반성은 없다. 마치 세종시는 스스로 완성된 도시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도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
“특별”이라는 허울, 자치의 실종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라는 지위를 가진 도시다. 그 말은 곧,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는 자치보다는 타성에 젖은 행정, 서울의 눈치, 정부 의존 속에 안주하고 있다.
“서울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중앙정부가 해결해주겠지.”
이런 의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방 문제는 지방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자치의 본질은 ‘주체성’에 있다.
지금의 세종시는 주체성 없는 도시, 의존적인 도시, 방향 잃은 도시다.
지역 시민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치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무관심한 시민은 무능한 정치를 낳는다.
그 정치는 다시 도시를 무너뜨린다.
세종시민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행정도시로 출범하면서 기대와 자부심은 컸지만, 지금은 일상과 제도의 경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역 언론은 힘을 잃었고, 시민단체는 존재감이 없다. ‘문제 제기’는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참여’는 ‘시간 낭비’로 치부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국가의 미래를 실험하고, 선도하고, 완성하라는 사명.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치권도, 행정수도라는 상징성도, 도시로서의 존립 가치마저도 잃을 수 있다.
지키지 못한 도시는 빼앗긴다.
그 빼앗김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의미의 소멸로부터 시작된다.
위기의 본질은 위기의식의 부재
어떤 문제든 인식이 먼저다.
지금 이 도시에는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문제를 말하면 불편해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적으로 돌린다.
이런 문화에서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무관심한 시민은 깨어나야 한다.
정치는 각성해야 한다.
이 칼럼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세종시가 처한 현실이다.
세종시는 지금 위기다.
빈 도시가 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결정은 누가 하는가? 우리 모두다.